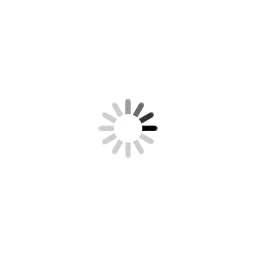집값은 진짜 폭락할까? 폭락론자들의 논리, 믿어도 될까?
요즘 뉴스나 유튜브만 켜면 꼭 한 명쯤은 나와서 말하죠.
"집값 곧 폭락합니다. 지금 사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말대로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로 집값은 폭락할까요?

오늘은 부동산 폭락론의 주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 그리고 왜 ‘집값은 항상 비쌌다’는 말이 나오는지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해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시간입니다.
왜 사람들은 ‘집값 폭락’을 외칠까?
폭락론자들의 핵심 논리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 저성장 경제: 경제가 더 이상 예전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않으니, 자산 가격도 오를 이유가 없다는 주장.
- 가계부채 증가: 대출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이자 부담으로 인해 주택을 팔 수밖에 없고, 이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논리.
- 인구 감소: 사람이 줄어드니, 굳이 비싼 집을 사려는 수요도 줄 것이라는 가정.
겉으로 보면 모두 맞는 말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직접적으로 집값을 하락시킨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 일부 지역은 맞아요. 집값이 하락 중이고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서울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학군, 교통, 인프라 등으로 수요는 여전히 넘치고,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죠.
서울 집값, 왜 항상 '비쌀 수밖에 없는가'
서울은 단순히 주거지가 아니라 기회의 땅이에요.
좋은 일자리, 좋은 학교, 좋은 인프라가 몰려 있는 곳이니 당연히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규제로 묶여있고, 새 아파트도 쉽게 짓지 못하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집값이 항상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는 화폐의 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1970년대 은마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65만 원. 당시 삼성 신입사원 연봉은 144만 원. 지금 봐서는 ‘헐? 싸네!’ 싶지만,
그때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10억 아파트만큼이나 비쌌어요.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한양 집값은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1777년 정선방 대묘동 기와집: 275냥 → 1798년: 500냥 → 1816년: 600냥 → 1821년: 700냥.
집값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비쌌고, 사람들은 그 당시의 물가 기준으로 부담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집값 폭락'은 가능한가?
사실 부동산 통계가 시작된 1986년 이후 진짜로 폭락한 사례는 단 4번입니다.
- 1991년: 1기 신도시 200만 호 공급
- 1997년: IMF 경제위기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2022년: 초급격한 금리인상기
이외의 대부분 기간 동안 부동산은 조정을 거치더라도 결국 다시 우상향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는 하락세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부는 집값이 급락하면 반드시 개입합니다
.
왜냐면 많은 국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집값 폭락은 곧 금융위기와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조절하면서 시장을 떠받칩니다. 결국 자산 가격은 다시 오르게 되죠.
무주택자에게 위로만을 주는 폭락론
사실 폭락론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은 심리적 위안이에요.
“지금 안 사도 돼. 곧 떨어질 거야.”
“집 산 사람들은 바보야. 우리는 기다리면 돼.”
하지만 그런 말에 너무 귀 기울이다 보면, 진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심리적인 위안은 주지만, 현실적인 자산 형성은 막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집값은 원래 비쌌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집값은 언제나 ‘비싸 보일’ 겁니다.
하지만 핵심지는 늘 수요가 공급을 압도했고,
화폐는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시장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위로받기보다,
데이터와 구조적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PIR로 봐도.. 본 집값 흐름, 지금은 어느 정도일까?
PIR은 예를 들어 10이라면, 현재 가구 소득을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이나 KB국민은행에서 나오는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PIR은 2021년 말 기준으로 18에 가까웠고, 2023년에는 조정 장세 덕분에 잠시 15~16선까지 내려왔었어. 하지만 2024년 중반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최근에는 16~17 수준을 회복했단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 공급이 있었던 시기에도 PIR은 12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말처럼 "예전에는 집값이 싸서 누구나 집 샀다"는 건 반만 맞는 이야기란른거죠.
그때도 집값은 '소득 대비 비쌌고', 지금도 비싸. 다만, 인식과 접근성, 정보 격차가 컸을 뿐입니다.
즉, PIR 흐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건 집값은 항상 부담스러웠고, 앞으로도 쉬운 투자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집값폭락 #부동산폭락론 #서울집값전망 #무주택자전략 #부동산투자팁 #PIR지표 #서울부동산
'▶ 0.1% 투자마인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투자 시장은 시계추와 같다. (Pendulum of Investing 이론) (0) | 2025.03.26 |
|---|---|
| 부동산 투자 영향 지도 : 상당히 괜찮은듯..! (0) | 2025.03.12 |
| 공모리츠, 부동산 펀드 분리과세 혜택 분석 (~26년까지) (0) | 2024.08.23 |
| 파킹형 ETF와 파킹통장 활용을 해볼까? (0) | 2024.08.23 |
| 주식 주가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7가지 기술적 차트 지표 (0) | 2024.08.16 |